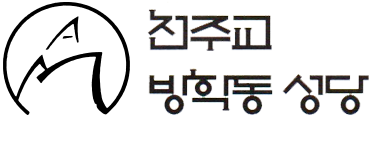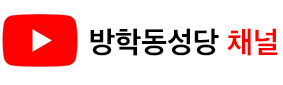[문암칼럼] 조선후기 문신,실학자 사암 정약용 생애 고찰(1)[강원경제신문-2025-11-05]
컨텐츠 정보
- 1,390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문암 박관우.역사작가/강원경제신문 칼럼니스트 © 박관우
본 칼럼에 소개하는 사암(俟菴) 정약용(丁若鏞)은 조선 후기(朝鮮後期) 실학(實學)을 집대성(集大成)한 문신(文臣)이요, 또한 실학자(實學者)로서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흠흠신서(欽欽新書)의 3대 저서(著書)를 포함한 500여권의 방대(尨大)한 저서를 후세(後世)에 남겼다.
필자(筆者)가 정약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외8대조모이신 해남윤씨(海南尹氏)의 친사촌(親四寸) 언니가 정약용의 모친(母親)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구체적으로 정약용의 모친은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緖)의 3남 윤덕렬(尹德烈)의 딸이며, 외8대조모는 9남 윤덕휴(尹德烋)의 딸이 되니, 이를 정리하면 사암의 모친이 외8대조모의 친사촌 언니가 되는 것이다.
덧붙이면 외8대조모는 조선(朝鮮)의 시조 작가(時調作家)로서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와 ‘오우가(五友歌)’로 유명한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5대손녀였다.
여기서 정약용의 호(號)인 사암과 관련해 언급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약용의 호는 다산(茶山)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약용의 호가 다산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유래가 있으니, 1814년(순조 14) 정약용이 강진(康津)에서 유배 생활(流配生活)중에 알게 된 문산(文山) 이재의(李載毅)로 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이재의의 아들이 영암 군수(靈巖郡守)로 재임시(在任時)에 문산이 강진으로 직접 찾아가서 정약용을 만나서 대화(對話)를 하면서 그 인연(因緣)이 시작(始作)되었다.
사실 정약용은 남인(南人)이며, 이재의는 노론(老論)이었기에 당파적(黨派的)인 관점(觀點)에서 볼 때 교류(交流)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러한 당파적인 이념(理念)을 초월(超越)하여 같은 학자(學者)로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사암(俟菴)을 만났다고 하니 문산도 대단한 인물(人物)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웅장(雄壯)한 포부(抱負)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유배지(流配地)에서 고난(苦難)의 세월(歲月)을 보내고 있던 정약용의 입장(立場)에서 볼 때 그야말로 천군만마(千軍萬馬)를 만난 심정(心情)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사암이 문산을 다산 초당(茶山草堂)에서 하루밤을 머물게 한 것으로 볼 때 서로간에 대화가 잘통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연을 시작으로 정약용과 이재의는 10세라는 연령(年齡)을 초월하여 교류하였으며, 1818년(순조 18) 사암이 해배(解配)가 되어 고향(故鄕) 마재 마을로 귀향(歸鄕)한 이듬해에 문산과 함께 문암 산장(文巖山莊)에 동행(同行)한 것으로 볼 때 당시 친분 관계(親分關係)가 깊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정약용은 1836(헌종 2)년 향년(享年) 75세를 일기(一期)로 별세(別世)하였으며, 그로부터 3년후인 1839년(헌종 5) 이재의도 향년 68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는데, 문산이 사암이 별세한 이후 그의 호를 다산으로 소개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현재도 정약용의 호는 다산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문암 박관우.역사작가/강원경제신문 칼럼니스트